해지는 노을이 아름답다. 찬란하거나 빛나거나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다. 숙연하거나 혹은 떠나버릴 듯, 그래서 더 아름다운지 모를 일이다. 한 해의 말미에 서 있다. 새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겠지만 지는 해는 늘 아쉽고 안타깝다. 그저 가는 저 순간들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면 나는 또 그득해진다. 내가 만난 그녀도 그러했다. -조영숙 시인/시낭송가
-------------------------------------------------------------------------------------
|
 |
|
| ⓒ 경북문화신문 |
|
# 시를 사랑하는 일은 호흡을 맞추는 일이다
공연할 때 의상을 맞추는 일은 때론 중요하다, 그것은 무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일과 같다. 시를 사랑하고 읊조리는 일이 나 혼자 좋아서 하지만 때론 공연을 위해 함께 맞추고 조율해야 할 때가 있다. 모두가 같은 의상을 입는 일도 있지만, 그보다 같은 듯 다르게 갖춰 입어도 하나의 느낌을 줄 때가 있다. 비슷한 계열의 색과 옷감을 통해 통일성을 주되, 모두가 하나로 표현되진 않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런 것 같다. 서로 다양한 삶의 모습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엔 감정을 읽고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호흡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내겐 시가 그렇다.
# 시는 꽃 하나를 달고 사는 일이다
삶의 격정이 물밀듯이 치고 올라올 때도 많았다. 그럴 때면 습관처럼 조곤조곤 나는 시를 읽는다. 시는 내 마음의 근육을 키워 주기도 하고 밥을 먹듯이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일과도 같았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몸이 아프면 약을 챙겨 먹어야 낫지 않는가. 나는 마음이 짓눌리듯 하프거나 정신이 괴로우면 그때마다 나직이 시를 읽었다. 그러면 그 아픈 시간이 흩어지고 약해진다.
어쩌면 나는 시 하나를 늘 가슴에 꽂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운동할 때도 시를 외우고 시를 생각하기도 하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시를 통해 위안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받은 건 다르지만 나에게 시는 특별했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자축하기도 하고 그런 감성이 있지 않는가? 영혼이 맑아지고 감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시처럼 예쁘 삶을 살고 싶고 나쁜 생각을 않하게 되는거지. 시에 대한 예의 같은 거지. 한 시인의 고유한 정신을 내가 읽는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거다
# 시는 내게 이렇게 왔다
늘 바빴다.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이따금 혼자 금오산 저수지에서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를 혼자 읊조리곤 했다. 그리고 거기에 내 힘듦을 내려두고 달래고 오기도 했다. 그러면 스스로 위로가 되었다. 시를 통해 위로를 받은 셈이다. 그즈음 남편이 내게 권해준 모임이 바로 재능 시낭송 모임이었다. 그러고 보면 남편은 내가 시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다.
첫 만남은 전원일기 카페였다.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시 낭송하는 모습을 보았다. 언젠가 시 낭송대회 권유를 받고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한용운 시인의 ‘알 수 없어요’를 조곤조곤 낭송했다. 감사하게도 첫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그 때 일은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있다.
# 누군가 나처럼 시를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따금 마음이 아픈 사람 사람한테 시를 권하고 싶다. 사람마다 받은 상처 다 다르지만 시는 어떤 문장으로든 다 위로가 된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멈춰지는 곳, 내 숨이 멈춰지는 곳, 거기가 바로 위로의 시가 들어온 자리다. 시는 배반하지 않는다.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는 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듯이 나는 시가 그렇다.
유홍준 시인의 ‘사람을 쬐다’를 만나고 아버지를 더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적도 있었다.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 삶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서로를 쬐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한 편의 시는 진정성으로 다가갔을 때 시도 내게 그렇게 마음을 건네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시의 번짐이라고 말하고 싶다.
# 가장 자연스럽게 말할 때 관객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시 낭송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오그라들게 했다. 시대가 달라졌다. 담백하게 말하듯이 읊조리면 좋겠다. 시라는 거부감 없이 서로와 서로에게 전해지면 좋겠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란도란 모여 시 한 편 들려줄 수 있는 환경이면 족하다. 그런 장소에서 그런 시를 낭송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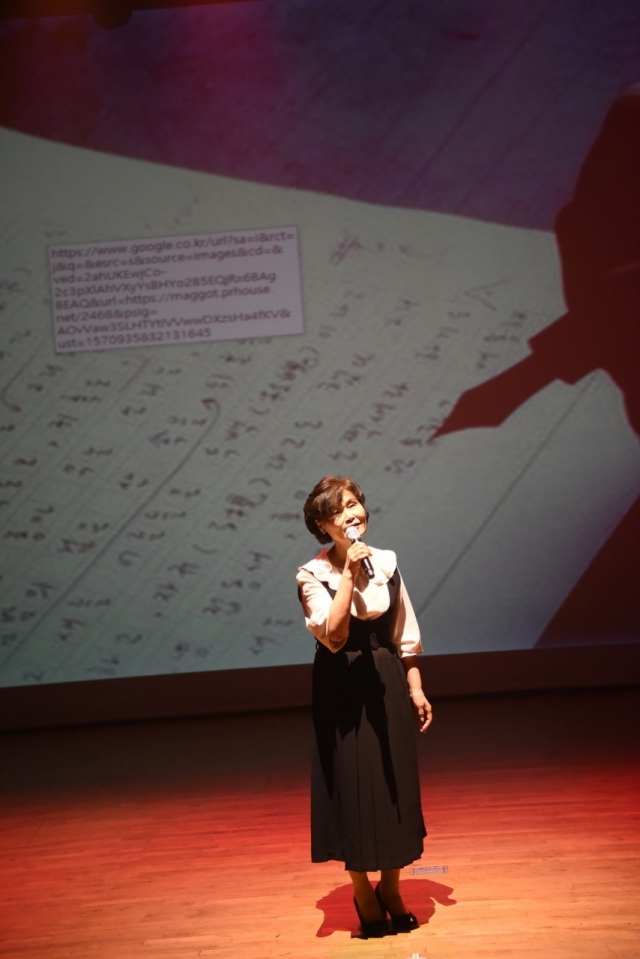 |
|
| ⓒ 경북문화신문 |
|
시는 시인의 손을 떠나면 읽는 독자의 몫이 된다. 내가 좋아하는 시를 마음껏 읽고 즐길 수 있는 시가 있어 인생이 행복하다는 그녀, 그녀를 만나고 돌아서는 길 석양이 더 짙어졌다. 오늘은 유난히 사람의 뒷모습이 깊고 더 아름다워졌다. 









